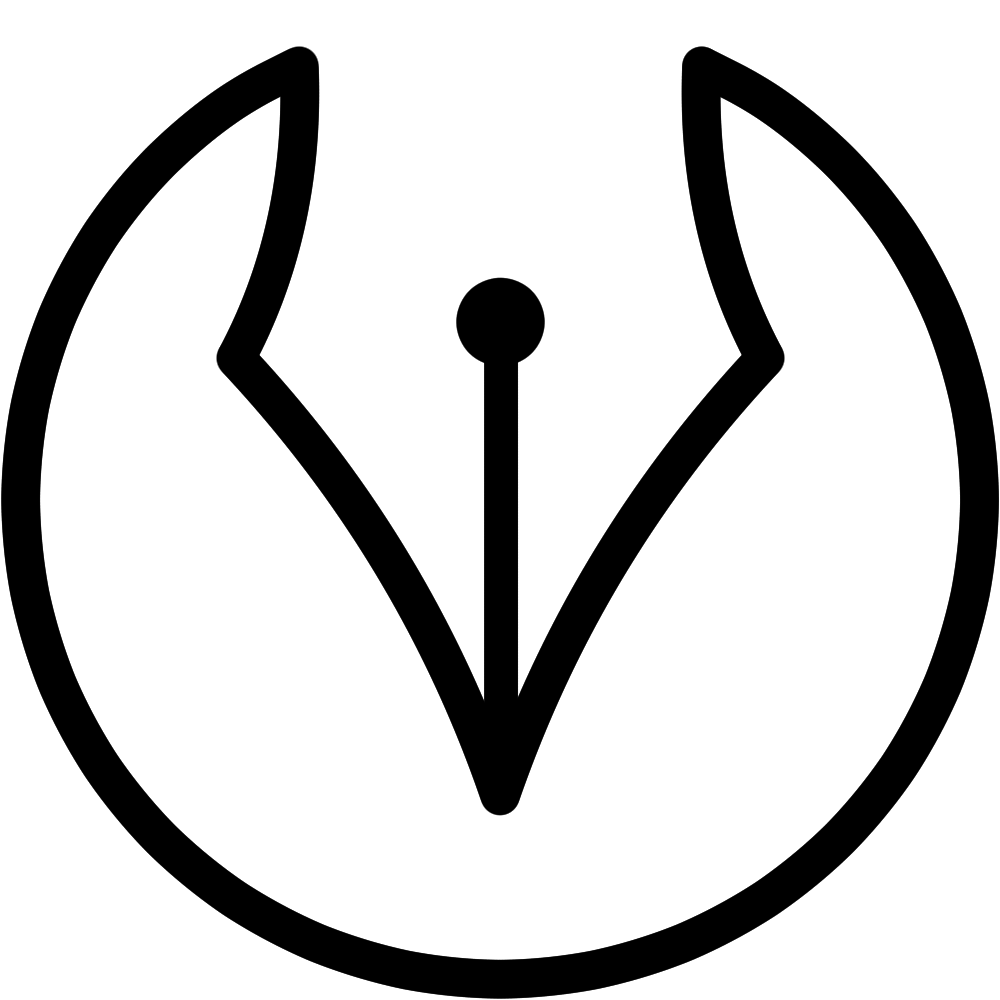나는 두 개의 꾸러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겨울 밤에 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름 낮에 본 것인데, 둘 다 공연의 일부로서 상연 시간 이전 또는 이후까지 일종의 꼬리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곽소진의 〈파라〉는 낙하산 천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접는 과정을 보여 준다. 양윤화의 《오렌지》는 폭신한 오렌지 모양의 공간과 그에 관한 생각을 담은 봉제품들을 커다란 가방에 담아와서 전시장에 펼쳐 놓는다. 두 작업에서 공연의 시공간은 이동 가능한 사물의 형태로 압축된다. 또는 거꾸로, 사물들은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습을 바꾼다. 꾸러미 상태에서 그들은 자명하게 존재하지만 거의 보여 주는 것이 없다. 나는 이 상태가 조금 귀엽고 또 수수께끼 같다고 느낀다. 이미 공연을 봤으니까 내용물이 궁금한 건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궁금함은 그들을 보는 나 자신의 상태를 향한다. 왜 곽소진의 낙하산 뭉치가 양윤화의 오렌지 가방보다 더 귀여운 것 같지? 단지 그쪽이 더 앙증맞은 크기라서? 이 판단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나는 종종 동시대 미술의 어떤 부분을 귀엽다고 말하지만, 그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으면 말을 얼버무린다. 제가 귀엽다는 말을 쓰는 방식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귀여운 것은 공연이 아니라 꾸러미다. 공연에 관해 말하자면, 곽소진의 것은 꺼림칙하고 양윤화의 것은 아름답다. 그렇지만 두 공연은 결과적으로 꾸러미가 되고, 그들은 어딘가 귀여우며, 그 간질간질한 느낌이 다시 공연에 스며든다. 여기서 꺼림칙함과 아름다움과 귀여움은 하나의 스타일로 식별되기 이전에, 심지어 판단의 언어로 표명되기 이전에,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전개되는 미적 상호작용의 서로 다른 방식을 말한다. 꺼림칙한 것은 밀쳐내고, 아름다운 것은 멈춰 세우고, 귀여운 것은 끌어당긴다. 나는 이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미적 행위자들의 드라마와 그 다양한 패턴들에 관심이 있다. 최초의 반응에 뒤따라오는 기억과 상상, 행위와 발화의 연쇄는 선명한 단언으로 종결되지 않고, 심지어 전적인 침묵 속에서 전개될 수도 있다.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거나 탈진할 수 있지만 어지간해서는 멈춰 서지 않는다.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은 듯한 자족적 아름다움은 이미 고대적 특질에 속한다. 우리가 예뻐라 하는 것들은 대체로 귀여움과 꺼림칙함 또는 멋있음과 허망함 사이에서 진동한다. 멋있음은 록스타의 미학이다. 그것은 단지 감탄을 요구한다.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에 수수께끼가 된다.
내가 귀엽다고 말하는 것들 중에는 아름다움의 작은 파편 같은 것들도 있다. 아름답다고 말하기에는 서로가 조금 민망하게 느껴지는 하찮은 것들. 모래사장에 흩어진 신의 잔해들은 귀엽다. 그러나 아름다움과 귀여움은 구별된다. 정말로 귀여움에 몰두하려면 그들이 작아졌다는 생각을 잊어야 할 것이다. 귀여운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스케일의 감각이 없는 것이다. 옛 사람들의 말처럼, 너무 거대한 것은 아름답지 않다. 반면 귀여운 것은 얼마든지 거대해질 수 있다. 미니어처가 건축 모형과 구별되지 않고 심지어 실재하는 집과 혼동되는 환상의 세계. 귀여운 것은 무력한 동물처럼 또는 그저 밀가루 반죽처럼 즉물적으로 힘을 흡수하고 변형되면서 독특한 매혹을 가진 중력장을 형성한다. 곽소진과 양윤화는 모두 그 장 자체를 접었다 펼치면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한다. 낙하산은 비행 장치는 아니지만 중력을 상쇄하여 추락에 따른 치명상을 방지한다. 오렌지는 마치 중력이 무효화된 것처럼 그 둥근 형태에 과즙을 가득 채운 채 공중에 떠 있다. 그들은 둘 다 중력에 저항하여 부력을 발생시키려는 인간의 노동을 상연한다. 그러나 그 노동의 물질적 결과는 바닥에 무심하게 놓인 꾸러미들, 자기 무게에 짓눌려 살짝 찌그러진 물체들이다.
살아 있는 몸이 꿈으로 충전된 죽지 않는 사물들로 치환된 모습은 귀엽다. 사물들과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힘의 장 속에서 그 작용을 수동적으로 각인하며 환상적인 반격을 도모할 때, 우리는 이미 귀여움의 중력장 속에 들어와 있다. 곽소진의 낙하산 뭉치는 그 내재성을 끌어안는다. 땅도 없고 날개를 갖지도 못한 자들을 위한 최후의 보급품으로서, 그것은 귀여움의 꺼림칙한 밑바닥까지 하강한다. 반면 양윤화의 크고 뚱뚱한 가방은 좀 더 높은 곳을 향한다. 그것은 우리가 무력하게 서로를 귀여워하고 때로 그 무력감을 털어내기 위해 서로를 괴롭히는 것과는 다른 존재 방식을 제시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실제로 관객의 눈앞에 주어진 것은 단지 거기에 오렌지가 들어 있다는 약속이다. 만약 그것이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관객을 설득하려 했다면 틀림없이 귀여워졌을 것이다. 만연하는 귀여움 속에서, 나는 가장 무상하고 하찮은 것들을 포함하여 세상만물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던 옛 사람들의 말들을 조금은 의아한 심정으로 떠올린다.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계와 귀여움으로 가득한 세계는 다르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달라진 걸까. 이렇게 귀여워진 우리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나. 그런 질문이 있다.
윤원화
책 만드는 일을 한다. 21세기 초반의 과도기적 상황이 상연되는 무대로서 동시대 미술에 관심이 있다. 저서로 『껍질 이야기, 또는 미술의 불완전성에 관하여』, 『그림 창문 거울』, 『1002번째 밤』 등이 있다. 역서로 『사이클로노피디아』, 『포기한 작업으로부터』, 『기록시스템 1800/1900』 등이 있다.